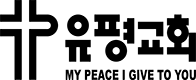이 본문은 앞의 본문과 이어지는 이야기이며, 율법사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율법사의 질문 (29절)
[29]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율법사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오니이까?”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27절의 대답에서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그에게 너무나 분명하였기에 하나님이 누구냐고는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의 이웃, 즉, 그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냐는 것이죠.
단지 옆집에 사는 사람인지,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지,
한 동네에 사는데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 이웃인지 아닌지 등등…
이것은 율법을 연구하는 그에게 있어 아주 당연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율법을 어기지 않을 수 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기서 그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그는 이 이웃의 범위를 꽤 넓게 생각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든 자기는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30절)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은 누가가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할 때 사용했던 전형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다른 묘사는 없습니다.
이것이 비유인 것을 생각해본다면 굳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고 그에 관련된 사항만 강조하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고
강도들은 그를 거의 죽게 만든 후에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은 절박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31-32절)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표현이 흥미로운데요,
강도 만난 자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마침 (혹은, 우연찮게, 다행히도)” 누군가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또 다른 강도도 아니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사장이었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종교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존경 받는 제사장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제사장”이었다는 것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보고
기대와는 다르게 피하여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 다음으로 기대해 볼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이었겠지만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33-35절)
[33]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35]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 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주어인 사마리아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된 사람들과의 강한 대조를 표현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귀신이 들렸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문헌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는 것은
돼지를 (그들에게 있어 가장 불결한 동물) 먹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당연히 율법사는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뭔가 선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피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고
(33절) 그 상처를 치료하고 돌봐주었으며 (34절) 그가 회복할 때까지 필요한 돈까지 기꺼이 지불하였습니다
(35절). 그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를 불쌍히,
즉, 긍휼히 여겨, 또는 27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사랑하여서” 도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필요 이상”으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였기에 상처를 치료해준 것 만으로도 그는 그의 책임을 다하고도 남은 것 아닐까요?
앞의 두 사람에 비교해 보면 그 정도만으로도 이 사마리아인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만약 그 다친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기만 해도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눅 17:10).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종조차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는 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서 돌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비유에서 사용하신 것은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착하고 선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혹은,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고 하신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도덕적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에 반하여
가장 낮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을 비유에서 사용하심으로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다음 두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36절)
[36]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29절에서 율법사가 했던 “내 이웃은 누굽니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 (범위, 자질)입니까?”였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가 자기 몸과 같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한 진정한 이웃이냐?”입니다.
이렇게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전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사는 “이웃”이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혹은, 민족적으로, 자질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이웃의 범위를 개념적으로, 즉, “나와 가까이에 있는 자”로 생각하셨던 것이죠.
율법사의 대답과 예수님의 명령 (37절)
[37]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율법사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문맥 상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은 “사마리아인입니다”였는데,
그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하여서 사마리아인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대답은 어떤 면에서 더욱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가까이 살던 사람도 유대인도 제사장이나 레위인, 혹은 사마리아인도 아닌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던 것이죠.
즉 이웃은 공간이나 민족과 같은 개념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자비 (혹은 사랑)”의 개념으로 묶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라거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가까이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네 몸을 돌보듯이 도와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처음 이 율법사가 질문했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와
두 번째 질문했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오니이까"라는 질문 모두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율법의 세부 항목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에 베푸는 자선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자신이 그렇게 "선을 행하기 때문에"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며 영생에 가깝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웃"이란 말을 다시 정의하시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심으로 그의 의롭지 않음을 보이셨습니다.
그 율법사는 자신의 의롭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린아이와 같이 바라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당연한 일, 당연한 삶
우리는 자주 이 이야기에 나온 "어떤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는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 당연한 일을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이웃,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는 먹을 것을 찾아 먹습니다.
내가 내 몸에게 선을 행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나는 아주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정말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소소한 행동들 하나 하나를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몸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다면 "누구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당연한 삶"입니다.